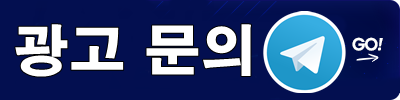[시간들] 전태일·김광석의 그 골목…아파트로 바뀌는 창신동 이야기
작성자 정보
- 먹튀잡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72 조회
- 목록
본문
동대문 앞 창신동, 임진왜란·일제강점기 수난 겪고 판자촌으로
일제, 창신동 돌산 깨트려 서울역, 한국은행, 신세계본점 건축
전쟁 후 평화시장 인력제공 기지로…전태일·김광석 발자취
서울시 재개발로 아파트촌 변신, 민중의 애환사 잊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열린 '김광석을 보다展; 만나다.듣다.그리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6.4.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선임기자 = 동대문(흥인지문)으로 한양 도성 밖을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가 창신동(昌信洞)이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동명을 제정하면서 조선 초부터 있던 인창방과 숭신방에서 한 글자씩 따 '창신동'과 그 옆의 '숭인동'이란 이름을 만들었다. 조선 고종 때 도성 동쪽의 기운이 약하다 하여 흥인문(興仁門) 이름 안에 지(之) 자를 넣은 것도 말해주듯, 창신동은 풍수지리상 지기가 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풍수는 다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창신동은 신기하게도 역사의 거센 풍파에 시달려왔다.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왜군 선발대가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이곳을 거쳐 동대문으로 입성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가 창신동 언덕의 돌산을 파내 아름답던 마을 풍경을 짓밟았다. 그때 깎여나간 창신동의 화강암으로 세워진 건물이 바로 서울역과 한국은행, 명동 신세계백화점(옛 일본 미쓰코시 경성점)이다.
총독부에 의해 도성 밖으로 내몰린 빈민과 채석장 인부들은 돌산 절벽 아래 토막집을 짓고 살아 창신동은 '토막촌'으로도 불렸다. 6·25 전쟁 이후엔 북한 실향민과 빈민들이 서울의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다. 정부의 섬유산업 부흥책으로 창신동 청계천 일대에 의류 제조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1961년 평화시장이 세워지면서 이곳은 동대문 의류 시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배후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다.
그 기구한 세월 속에서 생겨난 것이 미로 같은 골목과 봉제공들이 지친 몸을 누이던 판잣집, 그리고 청년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였다. 대구에서 올라와 동대문에서 리어카 뒤밀이를 하다 미싱 보조로 평화시장에 발을 디딘 전태일은 1970년 11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외침이 폭력으로 짓밟히자 "우린 기계가 아니다"라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랐다.
이 골목에는 가수 김광석이 살던 집도 있다. 김광석은 이곳에서 '노찾사', '동물원' 멤버로 활동하며 한국 대중음악사에 굵은 발자취를 남겼다. 김광석의 대표곡 '거리에서'를 들으면 1980년대 창신동의 짙은 어둠 속 가로등 아래를 외롭게 걸었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하다.
일제가 남긴 채석장 아래 전태일과 김광석이 각자의 꿈을 키웠던 창신동이 이제 서울시의 재개발 결정으로 약 5천 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조선의 한양 천도 이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터전이던 곳이 명품 주거단지로 바뀌는 것을 반가워해야 할지, 민중의 애환이 서린 아파트 아래 묻혀 잊히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
아파트가 들어설 그 자리 어디쯤, 후손들이 이곳의 지난 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단지 안에 작은 기념비라도 세웠으면 좋겠다. 창신동의 '핫플레이스' 돌산의 '절벽뷰'가 왜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